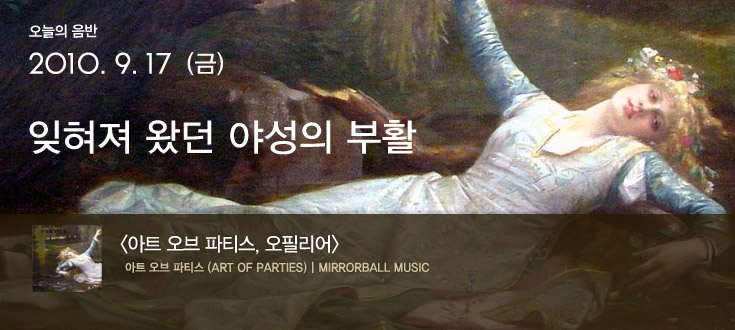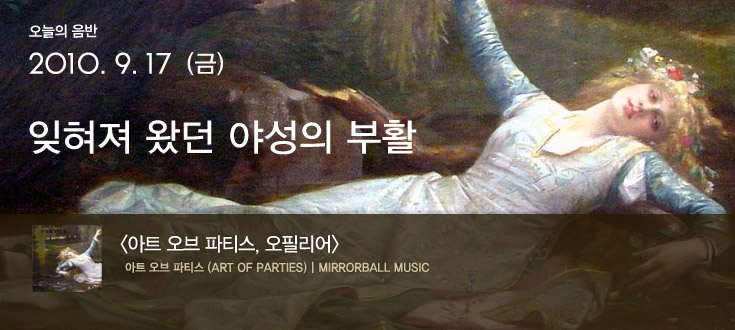|
Intro
이것만은 꼭 말해야겠다. 나는 본래 '록 키드'였다. 매순간 공허함과 지루함만으로 가득했던 이팔청춘부터 스무 살까지의 기간 동안, 그 간지나는 정체성만이 내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신경을 박박 긁어대는 거친 이펙팅의 빡센 기타 리프와 귓전 앞에서 꽝꽝 때려대는 드럼 난타가 나오지 않으면 '들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하던 적도 분명 있었다. 고 3 시절 방 안에서 슬립낫(Slipknot)의 노래를 틀어놓고 미친 듯이 머리를 휘둘러대다 목을 삐끗해서 며칠간 목 돌아간 좀비처럼 지내야 했던 기억도, 대학에 입학해 밴드 동아리에 잠시 적을 두었을 때 당시만 해도 조성모, 서태지 저리 가라 할 미성의 소유자였던 주제에 제임스 헷필드(James Hetfield)나 커트 코베인(Kurt Cobain)의 창법을 따라해 보겠다고 성대를 긁어대다 한동안 목에서 목소리 대신 피만 스며 나오던 기억도 내겐 '열정' 혹은 '자유' 따위의 뜬구름 잡는 허울 아래 나름의 즐거움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나는 록 '키드'였을지언정 록 '어덜트'는 되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가 크리스천이 되고, 연애사업에 심취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 후 취업난에 허덕이며 도서관에서 밤을 새는 사이, 이 정신 사납고 세련되지 못해 보이는 문화의 입지는 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좁아져 갔다.
그런데 이러한 '헤비니스의 소멸' 스토리 라인 내에서도 가끔씩 예외가 되는 멋진 소득들(작년 발매된 ‘아폴로 18’의 『파랑 앨범』 같은)이 존재해왔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내가 최근, 그러니까 무겁고 단단한(Heavy & Hard) 음악들로부터 거리를 둔 지 무려 5년여가 지난 2010년 여름이 되어서야 닫혀있던 둑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그 거친 바다로 뛰어들고픈 마음이 들게 된 데엔 어디까지나 그러한 '의외의 소득'들이 지금껏 그 둑을 해머로 내리치며 물줄기가 마르지 않게 유지해 준 덕택이 가장 컸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리뷰의 주인공인 밴드 '아트 오브 파티스(Art of Parties, 이하 'AOP')'는 내게 그 해머들의 연타 중에서도 실질적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낸 '결정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Verse 1
아는 사람은 아는 사실일 테지만 AOP는 '괴물 보컬' 김바다의 새로운 밴드다. 시나위 6집 『은퇴선언』을 통해 단박에 대한민국 록 보컬계의 독보적 존재로 자리매김한 이후, 자신의 밴드인 '나비효과(특히 2집)'와 '레이시오스(The Ratios)'를 통해 정통 록보다는 일렉트로와 혼용된 장르 실험에 매진했던 그가 다시 오리지널 록 밴드로 돌아온 것이다. 혹자는 'Art'가 들어가는 밴드명이나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 등장하는 비련의 여인 '오필리어'의 이름을 딴 앨범 타이틀, 그리고 19세기 프랑스 화가 알렉상드르 카바넬(Alexandre Cabanel)의 그림으로 채워진 커버 아트를 보고 밴드의 성향을 클래시컬하고 멜로디가 중심이 되는 스타일로 의심했을는지도 모르겠다(내가 그랬다는 뜻이다). 그러나 첫 트랙 「신기루 (Alternative Ver.)」의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인트로와 김바다의 'G0!' 하는 외마디 외침이 시작되는 순간 그런 의심은 단지 극 초반에 배치된 작은 반전 장치였을 뿐임이 밝혀진다. 이 앨범은 결코 당초 생각했던 계열의 스타일이 아닐 뿐더러, 김바다의 전작들에서와 같은 전자 음악적 경도와도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이 밴드와 앨범의 방향성을 규정짓는 새로운 키워드는 무엇인가?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다.
일단 앨범은 전반적으로 밴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표방한 '개러지 록'의 포맷을 충실히 따른다. 이는 비단 의도적으로 거칠고 투박한 질감을 고수한 각 악기들의 사운드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들이 보다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개러지 록'이란 틀의 본질이 되는 '정서'의 측면이다. 공연장이 아닌 창고(Garage)같은 곳에서 제대로 된 이펙터도 없이 악기와 앰프의 오버게인에만 의존한 채 자신들의 음악을 질러대던 중산층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거칠고 철없는 공격성. 그리고 그것이 품고 있던, 자금이나 기술의 조력조차 뛰어넘는 '무엇'. 이 앨범은 무엇보다도 그런 정서 자체에 집중해 모아진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 덩어리'에 가깝다. 심지어 모든 곡이 믹싱이나 더빙 없이 스튜디오 라이브를 통한 '다이렉트 마스터'로 녹음된 것들이라는 사실은 그런 인식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켜준다.
물론 여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단연 리더 김바다 소유의 영역들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창작과 공연은 본질적으로 '놀이'이며, '예술적으로 놀고 싶다'는 말로 새 밴드의 성향을 정의한 바 있다. 이를 대변하듯 앨범에 담긴 그의 보컬에서는 유려한 멜로디라든지 깊은 사색 및 철학이 담긴 가사 따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대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르렁거리는 톤과 얼핏 무식해 보일 정도로 원색적인 어법으로 삶과 인생에 대한 직선적인 외침을 토해낸다. 앨범 이전 발매된 EP의 타이틀 트랙이자 밴드명을 뒤집어 표기한 「Seitrap Fo Tra」의 '뚜껑을 까! 불을 붙여! 개겨버려! 태워버려! 갈 때까지! 소멸시켜! 생각 비워! 갈등 치워!' 같은 부분이나 「Hand Up」 의 '니가 원한다면 hands up! 지금 즐겁다면 hands up! 살아 숨 쉰다면 hands up! 니 맘 뜨겁다면 hands up! 우울한 생각모두 지워버려! 원치 않은 내 자신은 묻어버려!' 같은 부분이 이를 더없이 잘 드러내고 있다.
Verse 2
록 음악이 가진 강렬함과 파괴력 자체에 심취한 골수 마니아라면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할지 모르겠다. 그만큼 본작에는 뇌 운동을 멈추고 심장 박동을 촉진시켜 몸을 가만둘 수 없게 만드는 원초적인 폭발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그 선에서 멈췄다면, 한 때 '이 쪽 음악'에 발을 거의 떼었던 나 같은 이가 이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작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런 저돌적인 파워 이면에 내재된, 이를 통해 밴드와 그들의 음악을 단순한 '개러지 스타일'로만 치부할 수 없게끔 만드는 모종의 덕목들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밴드 구성원 개개인의 '실력' 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에게 편한 옷을 입은 듯, 곡 위에서 마음껏 날뛰며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김바다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가 우연한 계기로 한 차례 합주를 가진 후 곧바로 밴드 결성을 마음먹었다는 두 멤버 - 기타리스트 박주영과 여성 드러머 김주영 - 는 김바다와의 화학작용을 통한 폭발력의 생성은 물론이거니와 개별적인 연주 퀄리티 자체도 만만치 않다(밴드의 타이틀 송 「Art of Parties」의 기타 인트로나 「Shot」 의 드럼 전개를 들어보라).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음지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음악성을 표출하던 미국 땅의 수많은 개러지 밴드들이 대부분 수면 위로의 부상에 실패하거나 단명했던 이유가 그들의 태생적 한계인 '아마추어리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상기해보면, AOP의 각 멤버들이 보이는 프로페셔널한 면모는 이 밴드가 단순히 열정만 앞세워 내키는 대로 음악을 하는 모습으로부터 한 발치 나아가 있음을 가늠케 한다.
그렇다면 단지 이런 테크닉적 우수성에 의해 이 앨범의 가치가 좌우되는가? 물론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았다. 그것은 그들의 강력한 에너지 속에서 깊숙이 내재된 채, 밴드의 음악을 단순히 달리는 것 이상의 지점으로 격상시켜주는 음악적 흥취, 바로 '사이케델릭'의 잔영이다. 물론 밴드 본인들은 오리지널 밴드 구성의 작법으로 원초적인 '힘'과 '속도'를 드러내는 쪽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획득된 정서적 매력의 한복판에는 그 힘과 속도를 통해 청자를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로 빨아들이는 독특한 기운 또한 확연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두 가지 버전으로 실린 「신기루」나 「Die Out (Full Version)」의 후반부, 혹은 마지막 트랙 「Recover」에서 흡사 초창기의 사운드가든(Soundgarden)을 떠오르게 만드는 마성적 흡입력은 어떤 '계산'을 통한 것이 아닌 그들 각자의 필이 충돌하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것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밴드가 성취한 또 하나의 큰 성과를 분명히 해준다.
마지막으로 김바다가 이전에 매진했던 일렉트로 실험들의 단편을 드물게나마 잠깐씩 캐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본작의 흥미로운 요소 가운데 하나다. 「Art of Parties」 의 후렴구에 등장해 순식간에 곡 분위기를 댄서블하게 바꿔주는 무그 사운드나 「Mad 6」가 보여주는 강박적 코러스 라인, 나비효과 2집의 싱글 컷 트랙이었던 「Shoot The Chicks」를 연상시키는 「Your Fire」의 벌스 부분 등은 이전 김바다의 음악 이력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에게는 소소한 재미로 다가올 것이다.
Outro
그러고 보면 2010년 한국 헤비니스 씬에는 유독 새롭게 출발한 베테랑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듯하다. 제이워커(Jaywalker)를 통해 20여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밴드로 소원성취한 방경호를 비롯, 7년 만에 안흥찬-윤두병 괴물라인을 대동한 신작으로 돌아온 한국 스래쉬의 지존 크래쉬(Crash), 델리스파이스(Deli Spice)와 마이 언트 메리(My Aunt Mary), 껌엑스(GumX)의 멤버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옐로우 몬스터즈(Yellow Monsters), 결성 10여년 만에 멋진 데뷔 앨범을 발표한 인천 출신 멜스메 밴드 휘모리(Hwimory), 그리고 김바다의 AOP에 이르기까지...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와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탑재한 더없이 원초적인 유희로서의 예술. 그 자체를 이름으로 삼은 채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든 후 이제는 특별한 계기로 기억될 한 밴드와 그 앨범에 음악팬으로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오늘의 책을 리뷰한 '딕텔'님은?
문화콘텐츠학 석사 과정 진학을 준비 중인 20대 중반의 청년. AB형에, 왼손잡이에, 물병자리까지 완벽한 '4차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는 의외로 섬세하고 사려깊은 남자라고 자부함. 학창시절엔 만화가를 꿈꾸었고, 대학에선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로 활동하고, '군대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복무하는 등' 여러모로 흥미로운 이력을 지녔지만, 사실 그것들 중 뭐하나도 제대로 한 것은 없었다고 전해짐. 제대 후 음악취향 Y 에서 우연찮게 필자로 활동할 기회를 얻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