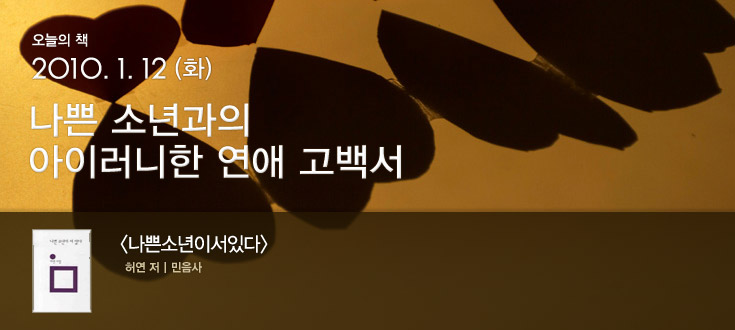|
순전히 우연이었다. 허연의 <나쁜 소년이 서 있다>라는 시집을 발견한 것은.
나는 시끄러운 세상을 향한 칼날 같은 글 속에서 은근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나쁜 소년’의 시구를 보았다. 그리고 첫눈에 그에게 반했다. 나는 그가 더 궁금해졌고, 세상에 막 나온 뜨거운 그의 언어를 일부러 찾아 읽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첫눈에 반한 그와의 만남은 나에게 그만큼의 설렘이었다. 어떤 신호였다.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서,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항상 ‘나쁜 소년’을 꺼내들었다. 읽고 또 읽으면서 첫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즐거운 확신을 계속했다. 그러다 종종 울컥하고 차오르는 눈물을 막으려고 남몰래 눈을 끔벅이거나, 벅차오르는 감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컴퓨터의 자판을 두들기며 메신저의 친구에게 공감을 재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처럼, 연모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동안, 옆자리에 앉아 있던 어떤 이는 그에게 닿아 있던 내 옷자락을 밀쳐냈으며, 또 다른 이는 이어폰과 휴대폰으로 무장하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였다. 게다가 컴퓨터 화면의 메신저는 신나게 두들겨댄 나의 흥분을 뒤로 한 채, 나쁜 소년이 아닌 내 자신의 눈먼 사랑 고백만을 전하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문제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쁜 소년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내가 그에게 반한 것도, 모두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하나의 대답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일종의 아이러니에 직면한다.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매혹되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지독한 아이러니.
불빛이 누구를 위해 타고 있다는 설은 철없는 음유시인들의 장난이다. 불빛은 그저 자기가 타고 있을 뿐이다. 불빛이 내 것이었던 적이 있는가. 내가 불빛이었던 적이 있는가.
가끔씩 누군가 나 대신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 대신 지하도를 건너지도 않고, 대학 병원 복도를 서정이지도 않고, 잡지를 뒤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걸. 그 사실이 겨울날 새벽보다도 시원한 순간이 있다. 직립 이후 중력과 싸워온 나에게 남겨진 고독이라는 거. 그게 정말 다행인 순간이 있다.
살을 섞었다는 말처럼 어리숙한 거짓말은 없다. 그건 섞이지 않는다.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밖에 있던 자다. 다시 밖으로 나갈 자다.
세찬 빗줄기가 무엇 하나 비켜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남겨 놓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비가 나에게 말 한 마디 건넨 적이 있었던가. 나를 용서한 적이 있었던가.
숨 막히게 아름다운 세상엔 늘 나만 있어서 이토록 아찔하다.
-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밖에 있던 자다’ (14-15 쪽) -
“파편 같은 삶의 유리 조각들이 처연하게 늘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는 걸 잊을 때가 있다.”는,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더럽게 (그를) 치장하고, 소년이게 했고 시인이게 했고, 뒷골목을 헤매게 했던 푸른색을 잃어버린, 그러나 앞으로도 푸른색의 기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소년, 그 “소년이 서 있다.” "무슨 법처럼", 무슨 신호처럼, 내 앞에 서 있다. 그는 나에게 “돈 버는 곳에선 아무도 진실하지 않지만 아무도 무심하지 않”으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침묵하기도” 한다고 토로한다. “늘 작년 이맘때쯤처럼 사는” “집착도 끊지 못하고 밥도 끊지 못하”는 그가 “비루한 삶의 한 방편”에 대해, “비굴함”에 대해 그러므로 결국 “설움”에 대해 말한다.
그의 앞에서 나는, 하릴없이 내 삶에 들러붙어 있던 고독과 외로움의 흔적들을 위로받는다. 나른하게 기울어지던 누군가의 고단한 삶을 어깨로 밀쳐내며 인상을 찌푸렸던 지난 날의 나와 낡은 지하철이 실어 나르던 과거의 시간들을 떠올린다. 결국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는 나누어지지 않는 고독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내 어깨로 슬그머니 기울어지던 그의 삶이 내 것만큼 무거운 것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는 그를 만났고, 첫눈에 반했으며, 오랜 시간 함께 했으나 항상 혼자였으며, 그러므로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처럼 나도 '집착을 끊지 못'했고 '밥도 끊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왠지 홀가분하다.
- 컨텐츠팀 에디터 현선(anejsgkrp@bandinlunis.com)
|